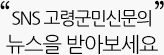|
 |
한국문인협회진흥이사/수필가/
동화 한봉수 |
|
음력 유월이 되니 비도 자주 온다.
천수답(天水沓: 수리시설이 불안전하여 비가 와야 모심기 하는 논) 시절이야 비보다 고운님이 어디 있을려고?. 수리 시설이 뛰어나며 혹여 수리시설이 덜된 논밭이 있다한들 묘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여도 생뚱소리 한다고 크게 경칠 말은 아닐 듯한 시절이 아닌가?. 비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밉상이며 농사 할 땅 한 평 없으니 ‘날품이라도 팔아 볼까?’ 하는 생각조차 못하는 늙은이가 된 지금, 멋쩍게 마지막 막노동판의 일화가 생각난다.
그래도 농가월령가 한 줄을 읽을 수 있었음이 큰 행운이었다. 열흘정도를 방콕(방에만 기거함)하다가 막노동 현장에 겨우 하루 일할 행운을 얻어 나간 날이었다.
전문 기술요원도 아니고 보조 잡일을 하자니 땀도 많이 나고 입에서는 단 냄새가 난다. 비가 자주 오다가 징검다리처럼 맑은 날은 높은 습도 때문에 더욱 더운 것 같다. 땀에 젖고 현장의 흙먼지에 절어 얼굴이 위장크림 화장 한 듯 누른 얼룩박이 황소 등짝처럼 되어도 닦을 여유가 없다.
어름냉수와 소금 한줌을 입에 털어 넣고 세월을 녹여 마셔도 갈증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차라리 꿈이기를 중얼거려 보아도 그림자 길이가 좀체 길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담배가 건강에 치명적으로 해를 준다고 금연운동을 자랑스럽게 하더라만, 이 순간은 차라리 흡연을 위하여 잠시 쉬고 있는 저이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신이 혼미해 가는 것도 같고, 피부도 검둥이가 되어 가는 것도 같고 잡다한 생각들이 요동을 치고 있다. 그래도 정신을 정말 바짝 챙겨야 한다. 덩치 큰 저 괴물들(굴삭기, 트럭, 불도저, 롤러 등의 건설장비)이 언제 덮칠지 모르니 전쟁 피난길 식구들 마냥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는 열어놓고 안전장구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군(軍) 시절 어려운 난간을 헤쳐 나가는 유격훈련처럼, 나의 몸과 영혼까지 저당 잡혀 창고 귀퉁이에 보관 한 듯 나의 참을성과 인내력이 바닥을 보일 시점에서야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하던 군가가 생각나고, 호랑이 반장님이 “현장 정리하시고 퇴근합시다.” 한다.
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얻었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하려는데
“ 참 아저씨는 퇴근 하실 때 감리실에 들리시라데요.”
“ 뭐라카노? 응? 내가 소장이가? 아이마 하다모태 반장이라도 되냐?” “책임 관리자도 아닌 나를 미첬다꼬 불러싼나” 등을 중얼거리면서 전달하는 녀석의 얼굴을 빤히 처다 보아도 도무지 무표정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잘못 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일진이 사납나 보구나.’ 하면서 감리실을 들어서니, 낮에 꼬장(까탈)부리던 사람이라 짜증이 매우 많이 났다.
“아저씨 남지 삽니까?”
‘미친놈 남지가 길이 백리도 넘는데 묻는 꼬라지 보라지’ “아니요”
“어디 사십니까?”
‘알아서 뭐 할라꼬?’ “고령사요”
“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보고 바로 알아보았는데, 이곳에서 일 하고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예”
“ 여보슈 늙은이 놀리면 못써요. 아무리 막노동판이라지만......”
“ 어르신 사실은 낮에 제가 어르신을 뵙고 긴가민가하여 이곳 책임자들께 물어봐도 잘 모르다가 어르신이 신문에 글 쓴다고 하여 백방으로 확인 하니 ...... 고맙습니다.”
“......” 그러고 보니 기억이 조금씩 났다. 필자의 수필 ‘봄의 소리 4’ 에서 소개 했던, 교통사고로 양 부모님을 잃고 슬픔 중에도 처음 만나는 사람을 부모로 생각하며 친 부모님께 다 못한 효도를 한답시고 이 늙은이에게 그렇게 다정스레 했던 그 젊은이 아니, 나의 양 아들이 이 사람이란 말인가?
“아버님 제가 갸 입니더예.”
著者가 꼭 두어 번 기도해준 것이 다였지만 슬픔을 극복하고 감리사 자격을 얻어서 첫 부임지가 이곳이라니 세상이 좁다란 생각이 든다. 終
붙임: 이글의 근간은 사실이지만 많은 허구구성을 첨가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주인공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
 회원가입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