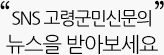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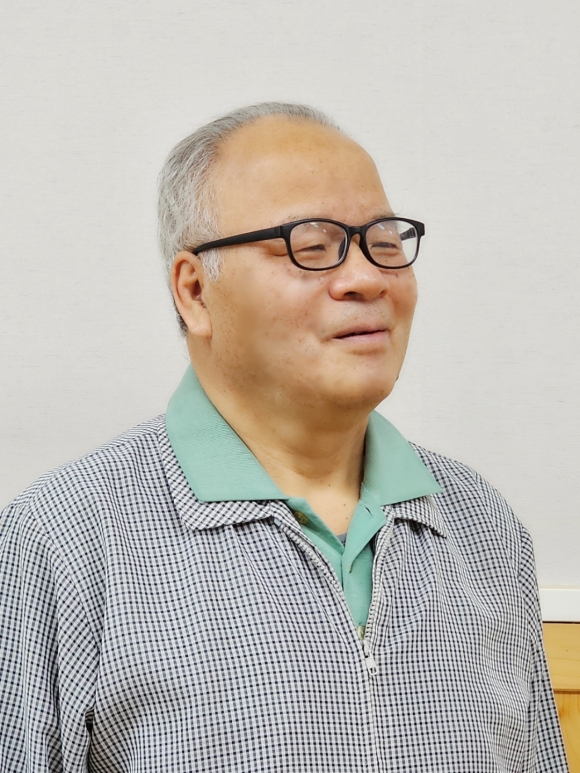 |
|
| 동화 한봉수 |
두터운 외투 자락을 한 뼘 쯤 잘라놓았다가 다가올 늦가을 끝자락에 맞출 요량으로 갈무리를 해도 될 만한 따뜻함이 얼굴을 가렵게 하고 있다.
특히나 겨우내 덥수룩한 뒷퉁수 머리카락 나부랭이에 파묻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던 목덜미 녀석은 더욱이나 가려움을 느낀다는 표현이 옳을 듯하다.
달려가는 계절 탓인지? 지구온난화 영향인지 모르지만, 개울가의 버들강아지는 홀라당 웃통을 벗어 제치고 보송보송한 솜털에 쌓여있는 맨몸을 햇볕에 말리고 있다. 비 맞은 뱀 새끼들 마냥 여린 가지에 매달려서 말이다.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봄바람을 기억하는 처녀 가슴 닮은 산수유 꽃망울은 노랗게 피어서 또 저렇게 노닐고 있다.
예전엔 배고픔을 잊으려고 쑥 캐고 달래 냉이 뜯었다지만, 지금은 추억을 더듬어서 가슴 고픔을 넘어 설 요량으로 봄나물을 벗 삼는다 하네. 육십 넘은 봄 처녀가.
요즘 유행하는 카톡의 어느 구석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조용한 웃음을 지어 본다.
대 도시의 독서실이 너무나 시끄러워 머리가 산만하고 정신 집중이 안 되어 산중의 사찰에 붙어있는 선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수험준비생을 향하여 수 만년을 조용히 참으면서 침묵하던 부처가 한마디 했다하는 “ 산속에 들어온다고 소리가 없어질 줄 알았나? 이 어리석은 중생아.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수많은 미물들의 저 소리도 피해 보거라.” 하는 우스개소리가 생각이 나서 어느 선인의 시 한수를 소개 하고자 한다.
萳春 冬日解
層雪 反添派
寂寞 幽居趣
溪禽 設少多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이라는 ‘봄이 왔건만 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봄기운이 약한 듯하여도 겨울이 지난 것은 틀림이 없고, 눈이 쌓여있어도 물결치다가 되돌아 온 것이니 (수증기가 눈이 되었으니) 곧장 물이 될 것 아닌가? 조용한 산골 외딴 오두막의 진정한 멋은 개울가에서 조잘거리는 산새들의 노래임을 알고 즐기시게나.
사람이 命을 다하여 시신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가장 마지막 까지 느끼는 감각이 청각(聽覺)이라고 본다면 죽어봐야 조용함을 알지 어디 죽지 않고 극도로 조용한 곳을 만나기가 쉬울까?
군 복무시절 깜깜한 밤에 홀로 보초를 서노라면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그렇게 정다웠고, 멀리서 새소리라도 들려오면 흔쾌히 詩人(시인)도 되어 보고 반쯤 취기 오른 낭만가(浪漫家)가 되어 보았지 않았던가?
이토록 정겨운 소리들을 떨쳐버려야 할 존재로 생각하는 그 잘난 수험생이 준비하는 수험을 운수 좋게 통과하여 목적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였다손 치더라도, 생활환경에서 소리 없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삼십 여 년 전만 하여도 먹는 물 즉 食水(식수)에 관한 법률도 없었고, 산골 개울물을 아무른 거리낌 없이 마셔도 별 탈이 없었으며, 각 동네마다 공동 우물을 사용하여도 서낭당 조상신의 덕택인지는 모르지만 그럭저럭 살만하였던 같다.
지하를 수백 수천 자(尺)나 파내려가서 가만히 있는 물길을 퍼 올리고 또 소독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수 만년동안 조용히 한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빙산수를 비행기 상석으로 모셔 와서 머리 좋은 국립식품안전처의 확인을 받는 우스개 말로 온갖 발광을 하고 난 물을 마셔야 조금 마음이 놓인다 하니 이거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가관이다.
먹고사는 생활전선의 고달픔만으로도 출산조차 걱정하는 새댁에게 시댁가풍을 배우라고 “눈 감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다물고 3년”을 설명하거나 강요한다면, 저 무식한 여의도 꾼들처럼 오른손에 촛불 들고 왼손에 태극기 들고 “물러가라 ! 시 할배야 !.”를 부르짖을까?
아지랑이 붙잡는 방법과 넘어져서 피나는 무릎팍의 아픔은 할애비의 “호오”하고 불어주는 입김이 최상급의 약이라고 노래하는 “진정한 봄의 소리”를 짐작이나 할라나?
|
 회원가입
회원가입